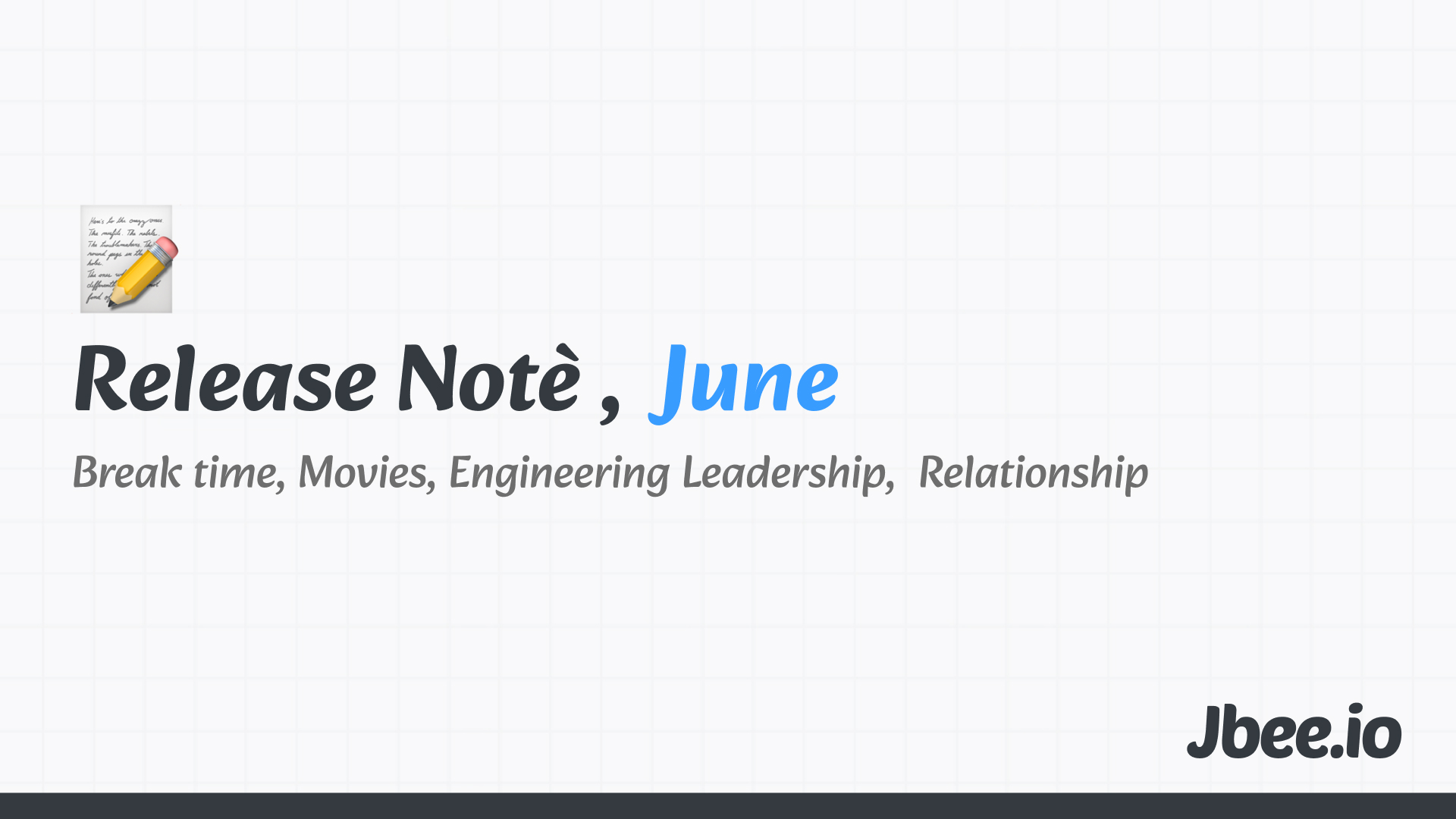
작년 6월은 발리에 있었다. 리프레시 휴가를 받아 혼자 다녀왔다. 분명 기억에 남을 여행이지만 혼자 하는 여행을 썩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다.
쉬어가기
작년을 생각하면 1년이 엄청 짧게 느껴진다. 퇴사 후 1년 동안 꽤 많은 일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퇴사를 했다. 그동안 일을 쉬고 있더라도 이런 저런 고민으로 쉴새없이 달려왔다. 그래서 올해 6월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시간을 흘려보내기로 했다.
게임
중학교 이후로 게임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실력 이슈도 있다. 거의 모든 게임을 잘 못한다. 그래도 오랜만에 게임을 하기 위해 게이밍 PC를 샀다. 약 3주 정도의 지났는데 하루 평균 게임 시간이 3시간을 못 넘겼다. 이번 계기로 게임은 나랑 잘 안 맞는다는 것을 배웠다. 꽤 많은 비용을 들였지만 해보지 않았으면 후회했을 것이다.(..) 그래도 명작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꾸준히 시도해볼 예정이다.
간단한 웹 게임을 만들어봤다. 이참에 Claude도 결제해서 Claude Code를 써봤는데 처음부터 만드는 입장에서 꽤나 괜찮았다. ChatGPT로 PRD를 구성하고 설계를 마친 다음에 지시사항만 전달해서 토큰을 아꼈다. 당연하게도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잘할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찰떡같이 알아듣더라. 기대 이상이었다.
6월의 영화'들'
찜해둔 영화들을 하나씩 보기 시작했다. 꽤 많은 영화를 봤는데 기억나는 영화는 아노라, 프렌치 수프, 씨너스 죄인들 요 3개의 영화가 기억난다. 그래서 이번 달 회고는 영화로 가득 찰 것 같다.
아노라
아노라는 강렬한 스토리에 몰입됐다가 예상치 못한 구성에 갸웃했다. 이 장면이 왜 들어가는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씬이 꽤 있었다. 주된 흐름과는 맞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결말도 잘 이끌어 가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마무리 되는 것 같아 좋았는데, 마지막에 개운치 못한 장면이 끼어드는 바람에 생각에 잠겼던 영화다. 영화적 장치와 의미를 찾아봤는데 다른 영화를 한번 더 본 것 같은 영화였다. 노동에 대한 영화라는 이동진 평론가님의 해석이 있었는데 정말 해석을 듣지 않았더라면 모르고 지나갔을 관점이었다.
프렌치 수프
미식에 대한 이야기이다. 영화에서 요리 과정을 꽤 자세하게 묘사한다. 수준 높은 미식가와 그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셰프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리더십과 팔로워십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표현으로 디렉터와 테크니션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
- 디렉터는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테크니션은 이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 의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현실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 디렉터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를 또는 여러 가지를 서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테크니션은 그 연결을 완벽하게 구현해야 한다. 단순한 연결을 넘어 조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잘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디렉터는 이상향을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지시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테크니션이어야 한다.
둘 중 무엇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다 중요하다. 디렉터와 테크니션은 What과 How로 바꾸어도 말이 된다. 아름답고 슬픈 이 영화에서 이런 관점을 끄집어내버렸다.
그리고 좋았던 표현들도 있다.
- 입맛은 좋은 추억과 문화를 필요로 한다
- 유쾌한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
- 행복은 갖고 있는 것을 계속 열망하는 것이다.
씨너스:죄인들
가장 최근에 있던 팀도 음악 도메인 회사였다보니 '음악'이 갖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이 많았다. 음악은 분위기를 만든다. 음악은 공간을 가득 채울 만큼 부피가 크다. 음악은 밋밋한 영상을 특별하게 만든다. 음악 없는 영화는 상상할 수 없다. 의도를 가진 음악은 장르를 바꾸기도 한다.
이 영화는 음악이 주된 소재는 아니지만 꽤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블루스'라는 흑인들의 음악과 '포크'라는 아일랜드계의 음악을 대비하면서 하나의 문화가 어떻게 다른 문화에 영향을 주는지 보여준다. 음악도 음악이지만 이 영화에서 음악은 그들의 '정신'을 대표하지 않을까.
Engineering Leadership
9개의 팀과 이야기를 나눴다. 주로 리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짧은 시간동안 꽤 많은 팀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9개 중 6개가 리더 포지션 제안이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개인적인 상황이 바뀌어 일관된 내용의 커피챗은 아니었지만 배운 점이 많았다.
- 채용하는 팀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며 경력이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은 기회가 아직도 많다.
- 개발 잘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분은 많지 않고 이와 동시에 여러 개발자들을 이끌 수 있는 분은 더 적다.
- 잘못 채용되거나 잘못 선정된 리더는 팀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 리더 채용은 어렵고 달라야 한다.
- 당연히 내부 인사 기용이 나쁜 선택일 수 있다.
최근 '좋은 리더를 넘어 위대한 리더로'라는 책을 다시 읽고 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지금 읽으니 감회가 또 새롭다. 초보 리더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 목록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중 첫번째 책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Worth the clicks
- The Relationship Is the Job
- Companionship 이라는 표현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채용을 할 때 라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한 단어로 잘 표현된 것 같다.
- 혼자 4개월 정도 사업을 해나갈 때 가장 큰 힘듬은 외로움이었다. The human teammate will be one of the most valuable roles of the future. 라는 말에 공감한다.
- 본문: https://www.workingtheorys.com/p/the-job-isnt-just-the-job